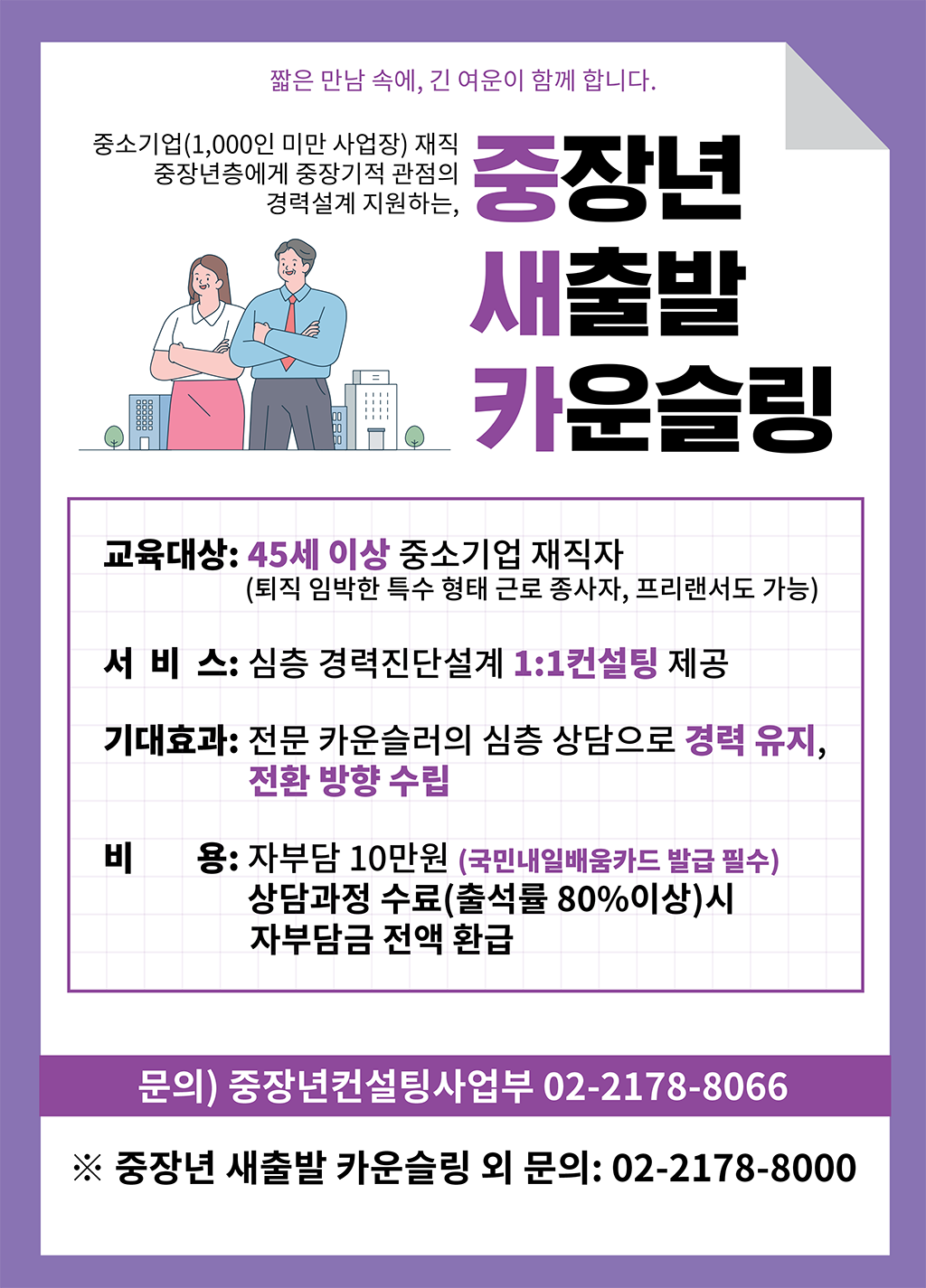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일차적으로 배고픔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여유로움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련 견지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란 개념은 일차적인 문제, 즉 최소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웃들이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는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직장만 고집하면서 실업 상태를 유지한다든지, 혹은 회사를 다니지만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있으면서 자신보다 훨씬 열심히 일한 사람과 보수가 차이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특성의 개인이나 집단을 경제적 배려,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아마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종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속한 조직이 파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떠나서 이런 태도, 다시 말해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혜택만 바라는 것은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이다.
정신적인 부자가 되어야 한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누군가 주변에서 잘되면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시기심으로 상대를 폄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실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상대가 잘 되는 것이 운이 좋거나 부모를 잘 만났거나, 튼튼한 동아줄이 있었기 때문일 뿐 나보다 잘났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부자가 된 사람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목표를 향한 집념과 열정, 전문적인 역량과 집중력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런 특성을 인정하고, 자신 역시 이런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인 방법이다.
한편 최근 양극화라는 개념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개념은 나날이 글로벌화 되어 가는 경쟁체제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쟁상대 대비 비교우위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개인이나 조직 모두에 적용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함께 한다는 말은 구성원 모두가 맡은 직분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양극화의 개념이 사회 전 분야에 확대 적용되는 과정에서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 등이 생겨나고 모든 부분이 이분법적으로 설명되면서 중간 계층이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사고가 양극화 되어선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조직이건 조직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중간계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라면 중견사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조직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장과 사원만 있는 듯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살 만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는 있을 텐데 우리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너무 무 자르듯 구분해 놓고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울 때가 많다. 계층을 나누어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상대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라는 생각 또는 나와 다른 것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당연히 상대에게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심어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은 아마 윤택해질 수 없을 것이다. 단언컨대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회복지도 의미가 없다. 스스로 마음을 맑게 가지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이를 정신복지라고 말하고 싶다. 어른과 상사를 존경하고, 선배를 믿고 따르며, 후배를 아끼는 마음, 잘못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정신적 복지의 기본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새 마음 운동’이 아닐까 싶다.
2011년 4월호
출처: [리쿠르트]